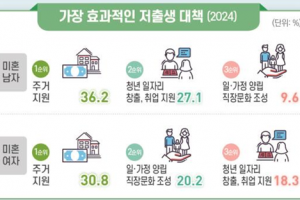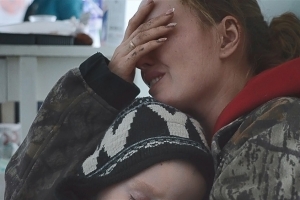[길섶에서] 사진관 전성시대

서동철 기자
수정 2025-05-23 00:25
입력 2025-05-22 23:35

여권을 새로 내느라 동네 사진관에 갔다. 다음날 사진 속 내 얼굴은 민망할 만큼 젊어 보였다. 과학기술의 힘이라고나 할까. 여권 발급 창구 직원은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언제 찍으셨냐”고 물었다. “같은 사람 맞느냐”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관 전성시대’ 특별전의 도록을 넘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고종 황제 사진을 찍었다는 지운영이 열었던 사진관은 1884년 갑신정변으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우리 사진관의 역사가 생각보다 깊은 것 같아 놀랐다. 외국인이 1904년 찍었다는 초가집 사진관의 모습도 눈길을 잡아끈다.
현상하고 인화해 흑백사진을 만들던 시절에도 ‘뽀샵’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필름을 수정대에 올려놓고 바늘처럼 길고 날카롭게 깎은 연필로 스치듯 움직이면 얼굴의 잡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여든을 앞둔 도록 속 사진사는 필름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변화를 한자리에서 겪었다. 아직도 사진관을 열어 놓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이 동네엔 나밖에 없어.”
서동철 논설위원
2025-05-23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